이 글은 시인 천상병님의 두 편의 같은 제목의 시 ‘장마‘를 감상하며 사색해 보았습니다.
귀천의 시인으로 잘 알려진 故천상병 시인은 31세와 60세에 ‘장마’란 시를 썼습니다.
우리 나라엔 매년 한 차례 반드시 오는 장마, 31살의 천상병과 60살의 천상병은 각각 장마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가 쓴 두 편의 시를 통해 그의 내면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상병 시인은 1930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귀천하셨습니다.

1. 31세 천상병의 ‘장마’
내 머리칼에 젖은 비
어깨에서 허리께로 줄달음치는 비
맥없이 늘어진 손바닥에도
억수로 비가 내리지 않느냐,
비여
나를 사랑해 다오.저녁이라 하긴 어둠 이슥한
심야라 하긴 무슨 빛 감도는
이 한밤의 골목어귀를
온몸에 비를 맞으며 내가 가지 않느냐,
비여
나를 용서해 다오.
혹시 비가 올 때 우산을 쓰지 않고 마치 샤워하듯 흠뻑 비를 맞아 본 적이 있었나요?

31세의 천상병은 장마의 어느 날, 머리에서부터 어쩌면 속옷까지 모두 흠뻑 젖었던 이야기하고 있군요.
머리카락을 타고 떨어지는 물줄기가 어깨에서 허리로 주루룩 떨어지며 이미 부르틀 대로 부르튼 손바닥에도 비가 억수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는 비를 피할 상황이 아니었나 봅니다.
비를 맞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에 이끌려 비를 피하지 않고 빗속으로 걸으며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식히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런 비에게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합니다.
31살의 천상병은 온몸을 흠뻑 젖게 할 정도의 사랑이 몹시 그리웠나 보군요.
또한 시인은 1961년도 어느 날, 저녁이기보다는 어둡고 불이 완전히 꺼진 심야이기보다는,
어느 집 창문 너머의 불빛이 골목을 비치는 그 시간, 어느 골목을 들어서는 입구에서 온 몸에 비를 흠뻑 맞으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집에 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는 비에게 말합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31살의 천상병은 그의 내면엔 무언가 말 못할 부끄러움이 많았나 봅니다.
그는 장맛비를 고스란히 맞아 온 몸이 물로 가득했을 때 그의 내면이 찾은 것은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사랑과 용서.
실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세차게 비를 맞아 온 몸이 젖듯이 갈망하고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 그리고 용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깊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내면에 숨겨진 부끄러움을 용서받아 온전히 치유되고 싶은 욕구.
젊은 천상병은 비를 맞으며 이를 충족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 60세 천상병의 장마
7월장마 비오는 세상
다 함께 기 죽은 표정들
아예 새도 날지 않는다.이런날 회상(回想)은 안성맞춤
옛친구 얼굴 아슴프레 하고
지금에사 그들 뭘 하고 있는가?뜰에 핀 장미는 빨갛고
지붕 밑 제비집은 새끼 세 마리
치어다 보며 이것저것 아프게 느낀다.빗발과 빗발새에 보얗게 아롱지는
젊디 젊은 날의 눈물이요 사랑이 초로(初老)의 심사(心思) 안타까워라-
오늘 못다하면 내일이라고
그런 되풀이, 눈앞 60고개
어이할거나
이 초로의 불타는 회한(悔恨)-
‘60살의 천상병의 장마’는 확실히 ’31살의 천상병의 장마’와는 달라 보입니다.
젊은 시절의 장마는 비를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맞을 정도로 동적이고 역동성이 있었는데,
60세의 천상병은 비를 관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몸으로 직접 느끼지 않아도 통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까요.
분명한 것은 60살의 장마 당시엔 뭔가 한풀 꺾인 느낌을 주는군요.

그는 장마에 ‘다 함께 기 죽은 표정들’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 옛 친구들을 회상하며 그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군요.
그들이 생각나는 것은 그립기 때문도 있지만 어쩌면 자신의 처지가 안쓰러워서 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그가 비와 비 사이에서 본 것은 과거 젊은 날의 눈물이요 눈물 속에 맺혀졌던 사랑이었습니다.

31살의 천상병은 빗물을 통해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기를 원했었는데,
60살의 천상병은 살아왔던 날들 속에 아롱진 눈물들,
세상을 살아가며 그의 온몸에 새겨진 상처가 터지고 덧날 때 남몰래 쏟았던 눈물들,
그럼에도 가슴에 안고 포기할 수 없었던 그만의 사랑.
이제 인생 늦은막길에 접어든 것을 알았는가, 시인은 회한(悔恨)에 빠집니다.
아마도 그의 회한은 그 사랑이 아직도 제대로 영글지 못했다는,
오늘과 내일을 얼마나 되풀이해야 하는가란 조바심에서 오는 안타까움이겠지요.
시인 천상병의 60살의 장마는 인생 끄트머리에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염원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3. 소감과 정리
이 시를 읽으며 지난 날 장마기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비를 흠뻑 맞으며 자전거를 탔던 날들이 생각나더군요. 매년 비올 때 동네 어딘가를 쉼없이 달리곤 했으니까요.
그러했기에 천상병의 31살의 시 느낌이 더 난 것 같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삶을 돌이켜 보면,
그는 38살때에 중앙정보부의 공작에 의해 간첩으로 오인되어, 온몸은 물론 뇌까지도 다쳐 그의 인생은 일찌감치 마감하며 분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이 예상하는 길을 가지 않았지요.
비록 그가 한때 걸인으로도 살았었지만,
그는 분노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갉아먹지 않았던 것은 31살의 천상병이 갈망했던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용서했기에 60살의 천상병은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였을 것입니다.
63세,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시 귀천에서 살아온 나날을 소풍이라고 했고 또한 ‘아름다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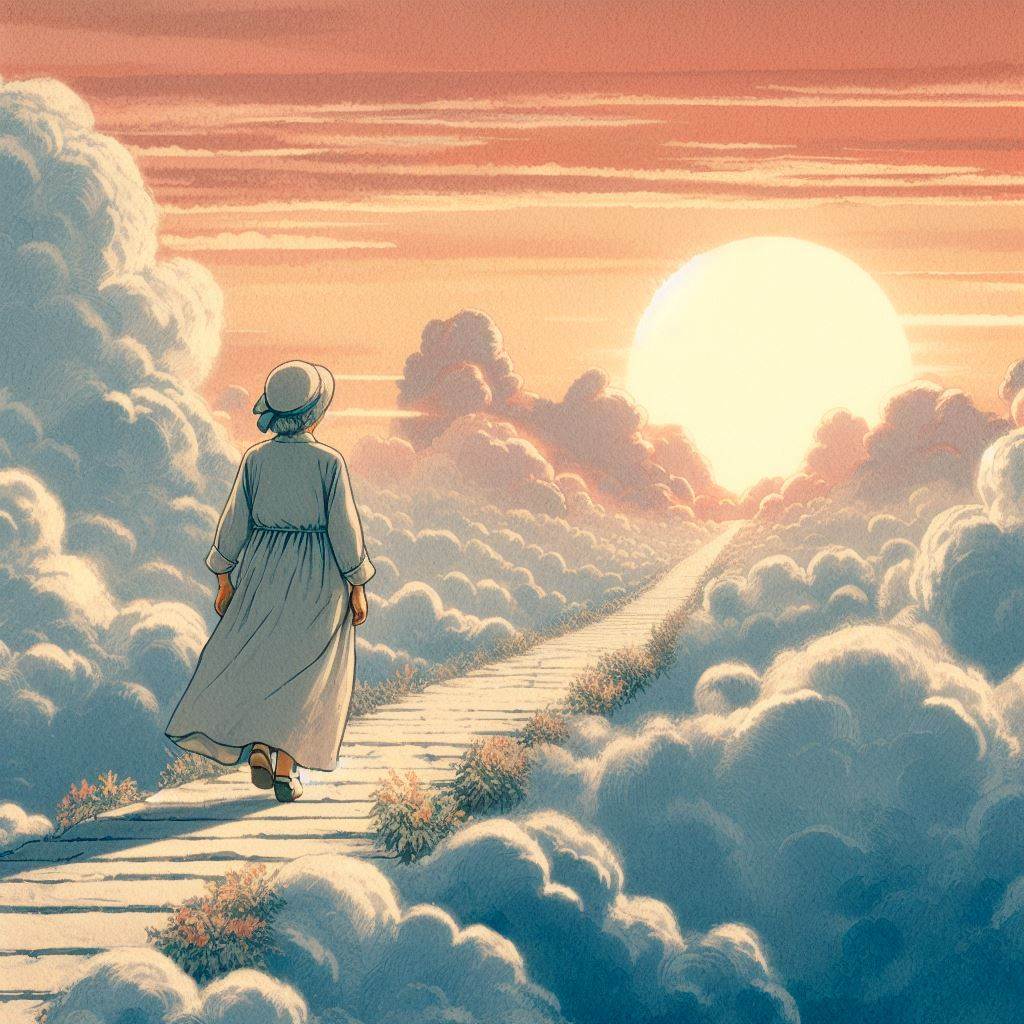
한편으론 나의 인생길에서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왔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아직 목숨줄이 붙어 있는 이때, 어떤 열매를 맺어 갈지 다시 한번 긴 호흡을 정비해 보고 싶군요.
오늘도 저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요즘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저는 7.8세 전후 어린시절 시골에서 어머니와 들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와 함꼐
소낙비가 내렸고 금새 옷은 졌고 일을 포기하고
엄마와 긴긴 좁은 들길을 소낙비를 헤치면 걸어오며
천둥번개 빛과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집에 왔는데 몹시도 두려웠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때 비에대한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비가오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네요!
핑백: 이애경의 선물6: 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