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이애경님의 39번째 선물, 시 ‘유물’입니다. ‘유물’하면 보통 골동품이 생각이 나지요. 이애경님은 무엇을 유물이라고 한 것인지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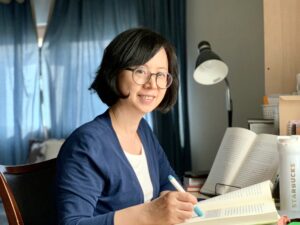
이애경의 유물
전래되어온 상처는
극심한 가뭄으로
마음에 금을 내고
메말라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에 이끌려
깊은 골짜기 만들고한이 되어
천만년의 유물을
만들어 간직한다.재연한다.
노을 지는
해질녘 오늘은
그 골짜기 고향
찾아 내려가
화해해야겠다.
세기를 넘나들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요즈음, 애 닳고 시린 마음이 생각과 융합된 혼란의 계절 앞에 애써 정리해 봅니다.
저마다의 아픈 기억이 생채기에 뿌리내리고 남은 흔적의 신경을 스칠 때, 나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할까요?
변명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그를 용서하는 것.
역설적으로 이것이 용서가 용서되게 하는 본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냥.. 질문만 남겨 봅니다.
답은 그대의 몫으로 남기고 말이지요..

이애경님의 시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의 제목이 ‘유물’인 반면, 글은 ‘용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물과 용서.
이애경님의 글의 내용들을 보면, 보통 시를 설명하는 경우 혹은 시와 관련되는 힌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주가 되었는데, 이번 글은 1막은 시를 통해, 2막은 글을 통해 이야기를 이어가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군요.
먼저 이애경님의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래되어온 상처는
극심한 가뭄으로
마음에 금을 내고
메말라
위의 시구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전래되어온 상처’입니다.
‘전래되어온’이란 ‘오래 전부터 이어서 전해온’이란 뜻을 가지므로 ‘전래되어온 상처’란 ‘몇 세대를 거쳐 이어온 상처’라는 의미를 가지거나 ‘자신의 어린 시절 등 오래 전에 생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온 상처’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 전체를 살펴보면, 세대간 내용이기보다는 한 개인의 심리 이야기로 보이기에 두 번째 의미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으로 마음에 금을 내고 메말랐다’고 합니다. 대지에 비 등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대지가 메말라 갈라지듯이, 메마른 마음에도 이러한 단비가 내리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전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에 이끌려
깊은 골짜기 만들고한이 되어
천만년의 유물을
만들어 간직한다.재연한다.
그로 인해 대지가 갈라지고 벌어지고 붕괴되면서 커다란 골짜기가 생기듯이, 마음도 역시 골짜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애경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이란 단어를 연거푸 사용했는데, 그 만큼 자신의 마음에 골짜기가 생긴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마치 ‘한(恨)이 가득찬 골짜기이며, 그 한이 ‘천만년의 유물’을 만들었으며, 그 유물이 그 골짜기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만년의 유물에서 천만년이란 시적 표현으로서 아주 긴 세월을 의미하지요. 마치 어느 동굴에서 석회암이 녹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만들어진 종유석이 연상되는데 마음에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유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애경님은 ‘재연한다’라는 시구를 바로 집어 넣었습니다.
‘재연한다’란 뜻은 같은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 것을 말하지요. 이 시에서 ‘재연한다‘란 오래 전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더욱 갈라지면서 더욱 깊은 골짜기를 만들고 더욱 한이 맺혀 더욱 큰 유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반복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유물은 오랜 세월 자신의 마음의 상처로 만들어진 그 무엇이 될 것입니다.
이때 그 무엇이란 ‘나의 또 다른 자아’로서 그 자아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금_여기’에서 합리적이면서 잘 적응하는 건강한 자아가 아니라, 바르게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자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라 ‘내면 아이’ ‘부정적인 어린이자아’ ‘취약한 어린이’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의 자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는 건강한 자아가 활동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아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요.
노을 지는
해질녘 오늘은
그 골짜기 고향
찾아 내려가
화해해야겠다.
위의 시구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정리가 가능한 그런 때에 마음의 골짜기에 있는 자신의 유물을 찾아가 화해를 시도하겠다’란 뜻이 되지요. 즉 자신의 건강한 자아가 내면 속에 자리잡은 부적응적인 자아를 정식으로 만나 그 자아에게 쌓여 있던 울부짖음 등 내적 고통을 들어주고 감싸 안아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내용은 ‘나의 건강한 자아가 유물과 같이 숨겨져 힘들어 하는 또 다른 나의 자아를 만나려 하는 결심 혹은 마음 가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를 이은 글에서는 ‘용서’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애경님은 용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
저마다의 아픈 기억이 생채기에 뿌리내리고 남은 흔적의 신경을 스칠 때, 나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할까요?
변명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그를 용서하는 것.
역설적으로 이것이 용서가 용서되게 하는 본질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내용들은 이애경님 자신을 포함해서 아픈 상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픈 상처가 난 것은 나에게 상처가 나도록 한 가해자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로 인해 나의 마음은 상처나고 치유되지 못했기에 마음의 상처가 벌어지고 골짜기가 생겼으며 그 곳에서 유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제 용기를 내어서 울부짖고 있는 나의 다른 자아를 만나려고 하는데, 실제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어.’
그러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이는 부당하게 박해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용서란 실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는 걸까,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용서’라는 것이 오히려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반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고뇌의 이야기. 마치 ‘나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어쩌란 말이야’라는 것에 ‘용서란 원래 그런거야. 그러니 그냥 용서해 줘버려’란 느낌입니다. 마음은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쉽게 결론내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것이 좋아’란 답안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또한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란 의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와 글은 이와 같은 인간 심리를 시와 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심리상담과정에서 타인에 의해 상처 받거나 박해 받거나 배반 당한 경험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나의 건강한 자아가 그렇지 못한 자아를 만났을 때 정말로 화해할 수 있는가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애경님은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 매스컴에서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와 같이 시와 글로 표현한 듯 하군요.


핑백: 이애경의 선물42: 시 쿠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