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이애경님의 열한번째 선물, ‘나에게 남은 여름’이란 글입니다. 이애경님은 이 글에서 알베르 까뮈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알베르 카뮈는 ‘내 안의 정복 당하지 않는 여름’을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이애경님은 이 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남은 여름’을 발견한 것 같군요. 이를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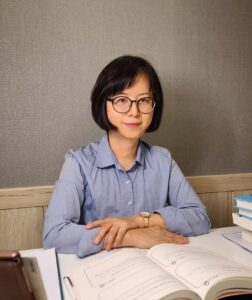
이애경의 나에게 남은 여름
나는 겨울 한복판에서 내 안의 정복 당하지 않는 여름을 발견하였다.
-알베르 까뮈(Albert Camus)-
실존주의적 소설을 많이 쓴 알베르 까뮈의 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겨울과 여름을 표현했군요.
그렇다면 과연 겨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겨울이란 그의 소설들을 미루어 볼 때, 이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한 적응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이 땅의 삶 자체가 적응하기엔 너무 어렵거나 모순적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적응하며 살기엔 무능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런데 그는 ‘정복 당하지 않은 여름을 발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발견이란 표현은 이전에는 있었는지 몰랐다가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네요.
정복 당하지 않은 여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느 대학에서 학기말 과제로서 ‘인생에 있어 최대의 위기가 무엇인가?’를 조사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인간의 최대 위기는 ‘죽음’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1969년 퀴블러 로스의 「On Death and Dying」의 5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부정 – 분노 – 타협 – 우울 – 순응의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실을 부정하고, 내면에서 분노가 끓어 오다가 결국 그 사실과 심리적인 타협을 한다고 합니다. 타협을 하면서 우울감이 올라온다고 하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죽음에 순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폰스 데켄 박사가 여섯 번째 단계로 ‘소망(Hope)’을 추가하였습니다. 죽음에 순응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실존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의 죽음 뒤에 하늘 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 곳에서 먼저 간 이들과 기쁨의 조우가 있으리라는 상상…
그것이 저에게 있어 이 땅에서 아직 남은 여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당신 안의 아직 남은 여름은 무엇일까요?

이애경님의 글을 읽으니 이애경님과 제가 서로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생각나는군요.
집에서 혹은 길에서 혹은 벤치에서 서로 말문이 터지면 다양한 주제로 서로 이야기 내용들이 많았었지요. 때론 철학적인, 때론 신앙과 관련된, 때론 인간심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때론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도 자주 했었는데요. 특히 이 글을 보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군요.
이애경님은 알베르 까뮈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에는 ‘겨울’과 ‘여름’이 서로 대비되고 있지요. 알베르 까뮈가 의미하는 ‘겨울’은 ‘어려움, 고난, 절망의 시기 혹은 이는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차가운 현실, 혹은 외부적인 시련과 역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존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그가 말한 ‘겨울’은 인간 존재의 불안정함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면 ‘여름’이란 희망, 내적 강인함, 그리고 인간의 저항하는 의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까뮈는 이러한 여름을 ‘정복당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며, 이는 외부 세계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회복력, 즉 내면에 자리 잡은 의지와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존철학관점에서 까뮈의 문장은,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인간은 내면의 희망과 의지를 통해 삶을 계속 살아갈 힘을 발견할 수 있다.”
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애경님은 겨울과 여름을 죽음과 관련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애경님은 퀴블러 로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인 ‘부정 – 분노 – 타협 – 우울 – 순응’와 더불어 이 이론을 보완하는 알폰스 데켄 박사의 6단계, 즉 앞의 5단계에서 ‘소망의 단계’를 추가하는 이론을 끄집어 냈습니다.
즉 죽음이란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위기로서 ‘겨울’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소망’이란 단계를 더 집어 넣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남은 여름’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바라는 바 소망은 ‘하늘 나라’. 그 하늘 나라에서 ‘먼저 간 이들과 기쁨의 조우’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고 했지요.
이애경님과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께 테스트 받는 기간’이라고 해석했었지요. 즉,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고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인 본향으로 갈 수 있다’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앞의 말들을 조합해서 다시 정리한다면,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으며 산다.
이 기간은 나에게 있어 겨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본향 즉 하늘 나라에 가서 산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때를 나에게 있어 여름이라 할 수 있다.’
일 것입니다.
이애경님은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남아 있는 여름을 꿈꾸며 살아왔다가 그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자 이젠 그가 가고자 했던 본향, 하늘 나라에 간 적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이란 겨울과 같은 삶에서 모든 것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생에서 죽음으로서 여름과 같은 새로운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알베르 까뮈는 이생이란 기간에서 여름을 꿈꾸었다면, 이애경님은 이생을 마친 이후의 새로운 기간에서 여름을 꿈꾸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알베르 까뮈는 그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정복 당하지 않은 여름을 발견함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실존주의’와 함께 이 땅에 알렸으며,
이애경님은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는 인생을 살아왔다가 이제 그것을 모두 마치고 그녀가 바라는 바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여름으로 살아가고 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