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이애경님의 28번째 선물, 시 ‘골방’입니다. 골방이란 ‘구석진 곳에 숨겨진 작은 방’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애경님은 특히 함석헌님의 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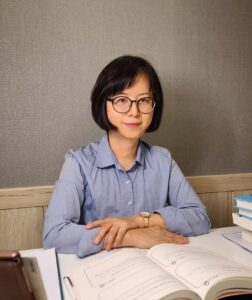
이애경의 골방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함석헌-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그대는 님 맞으러 어디 갔던가?
네거리에서든가?
님은 티끌을 싫어해
네거리로는 아니 오시네그대는 님 어디다 모시려는가?
화려한 응접실엔가?
님은 손 노릇을 좋아 않아
응접실에는 아니 오시네님은 부끄럼이 많으신 님
남이 보는 줄 아시면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여
말씀을 아니 하신다네님은 씨앗이 강하신 님
다른 친구 또 있는 줄 아시면
애를 태우고 또 눈물 흘려
노여워 도망을 하신다네님은 은밀한 곳에만 오시는 지극한 님
사람 안 보는 그윽한 곳에서
귀에다 입을 대고 있는 말을 다 하시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자 하신다네그대는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어디다 차리려나?
깊은 산엔가 거친 들엔가?
껌껌한 지붕 밑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엔가?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밑도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의 맘 은밀한 속에 있네그대 맘의 네 문 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면
극진하신 님의 꿀 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피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거나 또는 이미 다녀온 분들도 만날 수 있는 무더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더위를 피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함석헌님의 시를 만나니 한적하고 자그마하며 조용한 곳… 그 곳에서 시적 화자는 마음의 문을 ‘밀밀히’ 닫고 나의 소리를 들으려 경청했네요.
조물주는 인간을 본래 지으실 때 ‘시를 짓는 작품’ 즉, 포이에마로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시를 짓는 작품’ 자체로 나를 바라본다면… ‘시’를 통해 내면 안에 얽힌 감정과 욕구들을 언어로 퍼내어 나에게 보여줌으로 감정의 환기를 시켜줄 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소통하며 자기치유의 지평으로 넓혀지는 소중한 존재인 것 같네요.
이제 나의 다락방 속에 꼭꼭 숨겨두느라 힘들었던 질곡 위의 먼지들을 툭 투욱 털어내어…
지치고 시달린 나의 감정을 만나 위로하고 내면의 꿀 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런 “골방”이 나에겐 어디인지 찾아보아 나와 그대.. 영혼까지 쉼을 얻는 피서(避暑)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애경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함석헌님의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란 시와 이 시를 인용하여 쓴 짧은 글을 보면서 왠지 미소가 지어졌으며 한동안 그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시 내용을 보면서 함석헌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치하고라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이애경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밀밀히’ 내면 속의 내면을 깊이 찾아가는 느낌, 아마도 두 분 모두 어쩌면 ‘극 내향’의 성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극 직관’의 성향을 가지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함석헌님의 시와 이애경님의 글을 볼 때 두 분의 같은 듯 다른 모습들이 보이네요. 이를 찾아보면,
첫째, 함석헌님의 골방은 대단히 내밀한 장소로서 그 장소는 님과 만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마치 천상의 장소와도 같은 곳이지요. 또한 그 장소는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애경님은 그러한 골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도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방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이애경님의 골방 역시 함석헌님의 골방과 같이 내밀하면서도 천상의 장소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은 전혀 반대적인 방이지요. 그곳은 먼지가 쌓여 있고 음습한 곳일 수 있으며 혼자서 숨어서 자신의 고통을 절규하는 그런 방인 것이지요.
이 다락방이란 단어를 보니, 가수 이승윤님의 ‘달이 참 예쁘다고’란 노래 중 ‘숨고 싶을 때 다락이 되어 줄거야’란 가사가 생각나는군요. 이애경님이 이승윤님의 가사들을 해석하고 직접 나레이션해서 유튜브에서 올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자신을 숨기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 ‘마음의 동굴에 들어간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애경님과 이승윤님은 이를 다락 혹은 다락방으로 표현했던 것이지요.
이애경님이 함석헌님의 골방을 인용하면서도 다락방을 언급한 것은, 인간의 마음은 천상의 골방만 아니라 숨고 싶은 다락방도 있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그 다락방에 나와서 자신의 골방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를 더 더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이애경님의 공방과 다락방은 심리학적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나의 내면에는 건강한 자아와 건강치 못하고 취약한 자아가 함께 공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함석헌님의 ‘님’과 이애경님의 ‘님’은 서로 달라 보입니다.
이애경님은 ‘님’을 정확히 ‘나’ 즉 ‘자기(Self)’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니 이애경님의 골방에서는 ‘내가 나를 만나다’ 즉 ‘건강한 어른인 나가 취약한 어린이와 같은 나를 만나다’가 됩니다. 그래서 글에서 ‘자기치유’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치유의 과정이 끝났다면 그때의 골방은 아주 드라마틱한 곳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애경님의 시와 글을 읽으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는 성경 역대상과 역대하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두 저의 골방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때 저는 이애경님을 만났으며 또한 역대상과 역대하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났으며, 또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애경님, 다윗 등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바로 ‘나’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려고 특별한 자극을 주시기도 합니다. 나는 그들이 주는 자극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또한 행동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의 자기(Self)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나는 나 홀로 골방에 박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고 있으며 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이 주는 자극에 대해 반응함으로 나는 더 존재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를 더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방의 주체는 바로 ‘나(Self)’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애경님이 말한 골방이라는 뜻이지요.
반면 함석헌님의 ‘님’은 좀 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의 ‘님’은 ‘신적인 존재 혹은 깊은 깨달음과 내면의 진리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다른 글들을 읽어보면 ‘한울님’ 혹은 ‘한얼님‘이라고 표현한 그 분이 그의 님일 수 있어 보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대, 아마도 함석헌님의 골방은 이애경님의 다락방과 골방을 모두 합친 곳이며, 또한 그의 님은 ‘숨고 싶은 고통을 치유하면서 더욱 기쁨을 나누는 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는 각자의 골방’이 있으며, ‘나란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할 것인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존재란 결국 자신의 골방에서 ‘님을 만남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또한 그 골방에서 나와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이며, 이에 대해 두 분은 각자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매듭지어 봅니다.

